Marie-Louise von Franz
융의 신화를 읽다 1: 융의 문화적 유산
1. 융의 무의식 개념과 그 유산
1. 융의 문화적 영향력과 그 특성
2. 융의 무의식 개념과 그 의미
3. 학문적 인식의 상대성과 융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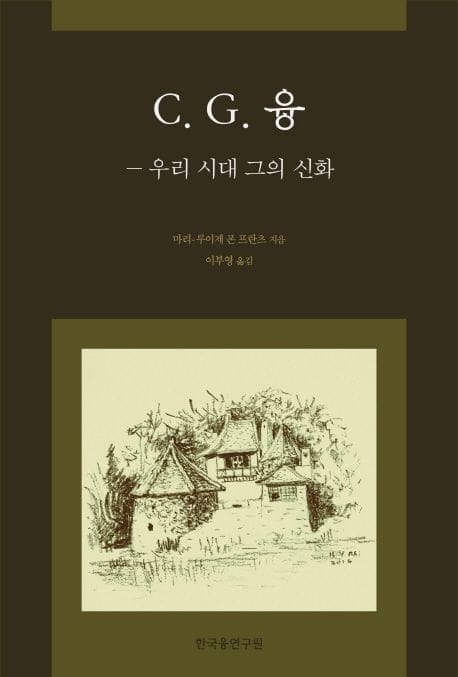
2. 신은 죽었다
1. 융의 어린 시절과 종교적 트라우마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융의 어린 시절 체험과 맞닿아 있다. 1875년 7월 26일 케스빌(투르가우 주)에서 태어난 융은 생후 첫 해를 라우펜의 목사관에서 보냈는데, 어린 시절부터 음울한 분위기의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는 집 근처 묘지에서 시신이 매장되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자기 곁으로 데려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더구나 어린이용 기도서의 내용을 오해하여 예수님을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로까지 여기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질된 것은 단순히 이러한 외부적 경험 때문만은 아니었다. 당시 기독교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문제였다. 종교적 신앙은 이미 본래의 생동감을 잃어버린 채, 의식적이고 집단적인 생활양식으로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 “신의 죽음”의 의미와 융의 해석
사람들이 “신이 죽었다”고 할 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만약 신이 인간의 체험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면, 그런 표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다. 과거 세대에게 ‘신(神)’이라는 말은 생동감 넘치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었지만, 현재 우리가 가진 신에 대한 상(像, 이미지)이나 정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과거 세대의 신상(神像) 속에서 심적으로 살아있던 것, 그들이 신을 감동적으로 숭배하게 만든 그 심혼적 작용인(心魂的 作用因)은 여전히 살아있다. (융이 후에 체험하고 증명하고자 했던) 신은 결코 과거의 상이나 정의 속에 진정으로 “갇혀있었던” 적이 없다. 그렇기에 신은 다시 그곳에서 나와 자신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니체처럼 “신이 죽었다”고 말하기보다, 융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즉, 인간에게 최고의 생명력과 의미를 부여하던 가치가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신은 이미 우리가 만든 상(像)을 벗어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그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4. 문화적 맥락에서의 신의 죽음
한 문화공동체가 고유의 “신”을 잃는 현상과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심리적 위기는 역사에서 흔히 반복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많은 종교의 신들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신의 죽음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비의(秘儀)의 핵심인 십자가 처형, 그리스도의 매장과 부활의 이미지 속에도 담겨있다.
